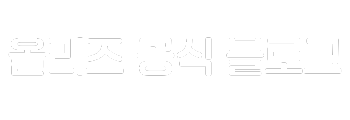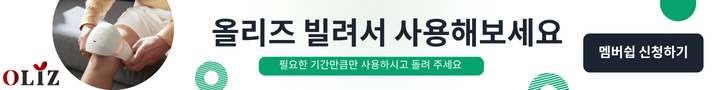한 줄 요약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치료는 결국 골관절염 보존 치료와 같은 길입니다. 핵심은 교육 + 운동(특히 신경근) + 체중 관리 + 통증 조절을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AAOS) 가이드라인은 운동·교육·국소 NSAID·체중 관리 등을 강하게 권고하고,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관절경 변연 절제의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정리합니다. 프로그램형 모델로는 GLA:D(교육 2회 + 6주 12회 운동)가 대표적입니다.
- 1편: 퇴행성 파열은 흔하지만, 통증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 2편: 왜 ‘남겨야’ 하나
- 3편: 수술이 ‘예외’인 경우
- 4편(현재 글): 보존 치료는 ‘프로그램’으로 — GLA:D 6주 로드맵
└ 바로 실천: GLA:D 신경근 운동 맛보기
1) 왜 OA 보존 치료와 ‘거의 같다’고 말하나요?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무릎 관절의 퇴행 과정(연골하골 변화, 활막염, 근력·신경근 조절 저하 등) 속에서 나타나는 골관절염 진행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무릎 전체 시스템을 재훈련하는 접근—교육, 운동, 하중·체중 관리—이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무릎 관절경 수술을 통한 반월상 연골판의 변연부 절제는 이득은 제한되고, 장기적 위험은 증가시킵니다.
2) 가이드라인 한 장 요약(환자용)
- 운동(감독/자가 포함): 통증과 기능 개선에 강하게 권고됩니다. 가능한 경우 감독 하 운동을 우선하되, 자가운동도 권장됩니다.
- 교육·자가관리: 질환에 대한 이해와 행동 변화(활동량 조절, 통증 허용 범위 설정)에 필수적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AAOS)는 교육·자가관리를 핵심으로 다룹니다.
- 체중 관리: 작은 감량만으로도 하중과 통증이 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합니다.
- 약물(필요 시): 국소 NSAID가 1차 선택지로 강하게 권고됩니다. 경구 NSAID 등은 상황에 따라 단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소염 진통제에 대한 설명은 이 글 참조).
- 하지 말 것: 진행성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관절경 세척/변연절제는 평균적 이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3) 현실의 빈칸: “운동·교육이 중요합니다”에서 멈추는 이유
병원 시스템은 수술·주사·물리치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표준화된 교육·운동 패키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선 “운동하세요”라는 말로 끝나 버리곤 합니다. 이 ‘실행 구조’의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 모델이 GLA:D입니다.
4) GLA:D란? (프로그램 개요와 근거)
- 구성: 교육 2회 + 6주 동안 12회 그룹운동(주 2회). 내용은 질환 이해·자가관리, 근력·신경근 중심 운동(관절 제어·안정). (상세한 내용은 GLA:D 프로그램 시리즈에서 확인하세요. GLA:D 시리즈로 바로 가기)
- 성과(다국가 즉시 결과): 통증 26–33% 감소, 보행속도 8–12% 증가, 의자 일어서기 18–30% 개선, 관절 관련 삶의 질 12–26% 향상 등 의미 있는 개선이 보고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하게 할까?”**를 설계한 프로그램입니다.

5) 집에서 시작하는 GLA:D 6주 프로그램
“운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정리해 둔 GLA:D 신경근 운동 맛보기 글로 안내드립니다.
이 글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순서대로 따라 하기: 준비운동 → 핵심 동작 → 마무리 스트레칭 흐름에 맞춰, 통증 허용 범위(0–10 중 3–5 이하)에서 진행하세요.
- 주 2회부터 시작: 통증이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 짧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록하기: 하루 활동량, 통증 변화(휴식 시/활동 후), 계단·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기능 과제를 간단히 기록하면 다음 주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멈춰야 할 신호: 지속적 잠김(무릎이 펴지지 않음), 밤에 깰 정도의 통증 악화, 붓기가 3일 이상 지속되면 진료를 권합니다.
6) 언제 병원에서 다시 상의할까요?
- 지속적인 ‘잠김’(무릎이 펴지지 않음/ 특정 각도에서 막힘)
- 3개월간 보존치료에도 변동이 거의 없음
- 후방 뿌리 파열(MMPRT) 의심, 연골판 탈출 심함 위 상황은 예외적 수술 적응증을 점검할 이유가 됩니다(3편 참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운동이 약보다 낫다”는 말이 과장 아닌가요?
A. OA 보존 치료에서 감독/자가운동은 강하게 권고됩니다. 국소 NSAID 등 약물은 운동 지속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GLA:D는 꼭 병원에서만 가능한가요?
A. 아직 한국에서는 공식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도입 시, 공식 프로그램은 인증 기관에서 제공되며, 교육 2회 + 6주 12회 운동의 구조를 따릅니다. 다만 위 로드맵처럼 철학과 원칙을 차용한 자가 실행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체중을 얼마나 줄여야 효과가 있나요?
A. 작은 감량만으로도 무릎 하중과 통증이 유의하게 줄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권장합니다.
참고 근거
- ESSKA 퇴행성 반월상 연골에 대한 컨센서스 : 3개월간의 보존적 치료 후 MRI촬영, 골관절염 근거 없을 경우에만 부분 절제술 고려
- 반월상 연골의 부분 절제술은 보존치료 및 가짜 수술 대비 우월하지 않습니다.
- 미국 정형외과 학회(AAOS)는 골관절염 환자에게 관절경적 세척 및 정돈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이 얼마나 흔한지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에는 67천명 정도가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약 47천명이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절제술을 권장하지 않는 국제 정형외과 학회 및 기관들의 권고에 따라서, 절제술 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권장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 데이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받는 환자의 75%는 50세 이상의 연령으로, 대부분 퇴행성 파열임에도 절제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심한 통증 때문에 환자가 수술 선호를 갖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편과 3편에서 통증과 잠김의 원인이 퇴행성 파열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봉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그 대안인 연골판 절제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골관절염으로 전환되는 빠른 길을 열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3편에서는 예외적으로 절제 및 봉합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현대 의학계의 전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4편에서 골관절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처하는 표준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GLA:D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 블로그 글 중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과장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 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리즈 이어 보기